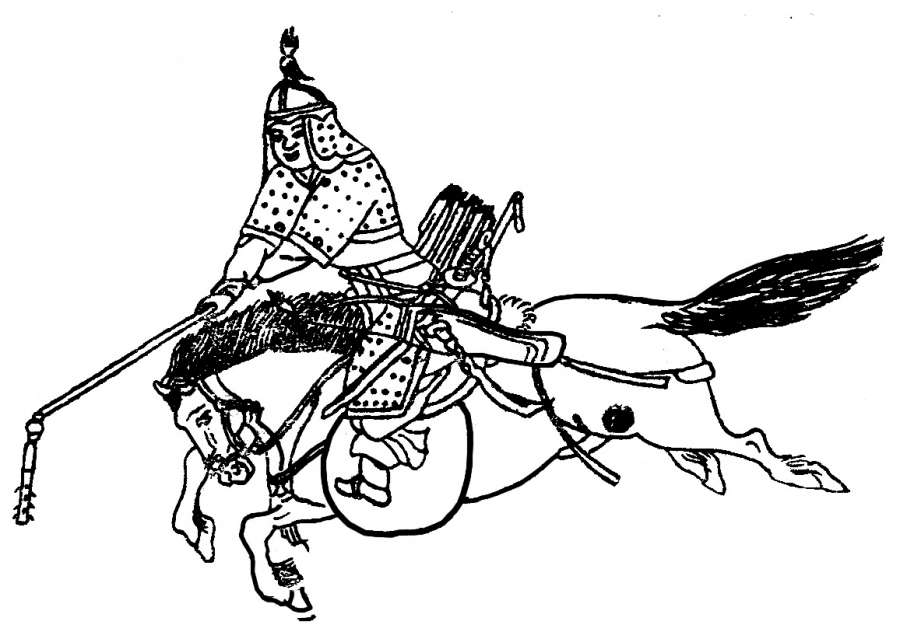안동일 작
도도히 흐르는 사랑
“절친했다니요? 섭섭합니다. 친하기로 말하면 장군님, 아이신 오라버니와 더 친하지 않았습니까?”
도도가 발끈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랬더냐?”
“네, 실은 라운 오라비가 저에게도 넌지시 얘기를 꺼내 오기는 했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장군님의 뜻을 제 뜻으로 알고 곁에 있기로 작정을 했다면서 라운 오라비가 마음을 바꾸라고 했지요.”
“흠 그래. 그게 언제 였는데? ”
“라운 오라비가 흑수 쪽에 관심을 갖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어제 오늘이고 한 두번입니까? 장군님도 아시잖아요? 떠나기 전날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요 하지만 저는 늘 하는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랬지. 나야말로 라운의 이야기를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들어 줬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쩌면 장군님에게 말이 들어가라고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무심했습니다.”
“네 탓이 아니다. 사람들 탓이지, 자꾸 어디 사람 어떤 구룬이냐를 따지는 사람들의 옳지않은 차별 때문이라고 해야지.”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주고 받으며 거진 장원에 도달했을 때 였다.
인근의 주민인 듯한 여인이 서너살 난 딸의 손을 잡고 아진과 도도의 앞쪽으로 지나쳣다.
여인은 아진 쪽을 보고 살며시 고개를 숙여 목례를 했고 아이는 배시시 웃어 보이면서 손을 흔들었다.
갈래 머리에 붉은 머리 장식을 한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 밝고 귀여워 아진은 심각한 이야기 도중이었음에도 아이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고 같이 웃어 주었다.
도도도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보고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아이 머리에 있던 헝겊장식 리본이 머리에서 날려져 저만큼 돌 포장의 잔도 위로 떨어졌다. 아이가 그것을 줏으러 그쪽으로 걸어갈 때 우두두 소리가 들리더니 저쪽에서 마차 한 대가 급하게 골목을 꺾어 달려오는 것이었다. 관에서 쓰는 쌍두 마차였다.
아주 위험한 상황 이었다.
“솔아야”
아이 엄마의 비명과도 같은 아이이름 부르는 소리 때문에 아진이며 주변의 사람들이 더 놀래야 했다.
마부도 아이를 발견하고 고삐를 당기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이가 더 놀래서 발이 얼어 붙었는지 움직이지를 못하는 게 큰일이었다. 아무리 고삐를 당기고 방향을 틀어도 말굽에 차이거나 마차에 깔리기 직전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이때 아진이 몸을 날렸다. 수벽치기의 다리걸기 수법으로 아이를 나꿔채 길 저편에 내려 놓앗다. 비호같은 동작이었다. 말움을 소리, 바퀴 끌리는 소리 사람들의 단발마 같은 비명소리와 함께 상황이 종료 되는 듯 했으나 아진이 몸을 펴려는 순간 쿵하고 바퀴와 그의 어깨가 부딪혔다.
잠깐 바닥에 주저 앉았다가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집으며 아진이 일어서 아이 옆에 섰고, 얼이 빠져 울지도 못하는 아이 곁으로 마부며 애 엄마며 도도가 달려 들었다.
“장군 괞찬으십니까?”
도도가 눈물이 글썽 해져 가지고 아진의 어깨에 두 손을 올려 살펴보려 했다.
적지않은 충격의 충돌이었다. 아진의 어깨와 부딪친 바퀴는 빠져 나가 저만큼 가지 굴러 갓고 마차는 바닥에 지르륵 끌리다 멈춰 서야 했으니 말이다.
뼈에 이상이 없었으면 했지만 도통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었고 심한 통증으로 미루어 뼈에 이상이 있는게 분명했다.
“나는 괞찬다. 약간 부딪힌것 뿐인데 뭐…”
짐짓 말은 그랬게 했다.
“괜찮은게 아닌데요, 어깨가 탈골이 돼 있잖아요.”
도도가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탈골된 어깨를 바로 잡으려 하는 통에 아진은 비명을 질러야 했다.
송구스럽다는 표정으로 옆에 서 있던 마부가 곱상한 생긴 여인네가 이렇게 용력을 쓰는가 싶어 휘둥그래져 쳐다보고 있었다.
“무에 그리 급히 달리는가?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길에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서 핀잔을 던지려니 엉망이 된 마차 안 에서 엉뚱하게도 내궁 주부가 기어 나오다 시피 걸어 나왔다. 아진도 잘아는 주부였다.
“자네가 웬일인가?”
아진이 계속 되는 통증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왕명으로 장군 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왕명이 내 어깨를 부러뜨리라는 것이었던 모양이지.”
인상 찌푸린게 미안하기도 했기에 아진이 짐짓 농담을 했다.
그러는 사이 아니 엄마가 와서 몇 번이고 머리를 숙이면서 감사 하다는 말을 하면서 아진의 부상에 어쩔 줄 몰라 했으나 도도의 권유로 아이의 손을 잡고 갈길을 갔고 일행은 아진의 장원으로 들어 섰다.
그 사이 아진의 어깨는 퉁퉁 부어 오르고 있었다.
팔은 간신히 움직일 수는 있었다.
의원을 부르던지 응급처치를 더 해야 한다는 도도의 성화를 물리치고 아진은 퉁퉁 부어 오르는 어깨를 한 채 내궁 주부와 함께 회랑 전실로 들어 갔다.
“그래 마마의 분부가 무엇인가? 서찰을 보내신 것은 아니고…”
“예, 서찰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급히 가서 장군을 모셔오란 분부셨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일이 어떻게 됐단 말인가? 마마께서 오라시면 가야지.”
“어찌 그몸을 하시고…”
“왜 어깨 좀 빠졌다고 죽기라도 한단 말인가?”
“마마께서는 격구장에 계십니다. 날도 풀리고 했고 오랜만에 운동을 하시러 나가시더니 소직을 은밀히 부르셔서 장군을 모셔 오라 하셨습니다.” (계속)